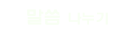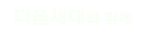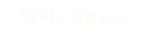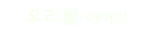게을러서 지난 봄, 여름에 찍은 사진을 아직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지 못하고 있다. 가금 저녁 늦은 시간에 지난 시간 쯕은 사진을 보면서 정리하고 크기를 줄여서 올려 놓다가 보면 조금 설명도 쓰고 그때의 감정과 생각도 쓰고 싶은데 아직도 뒤에 남은 사진들이 많아서 그저 사진만 수북히 올려 놓고 만다.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니 대부분이 아이들 사진이다. 주로 사람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찍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을 찍을 수 있었던 같아서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찍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사진 보다는 자연을 찍는 것이 좋다고 하고 꽃이며 풍경을 찍기를 즐겨한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족이 아니고는 내 사진의 모델이 되어 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내 가족들이라고 그리 호락 호락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지도 않는다. 덕분에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몰래 찍기도 한다. 일명 “몰카”라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찍어야 그 사람의 표정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에 비하면 자연은 참 여유롭다. 꽃을 찍는 일도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들은 나를 기다려 주고 사진 찍는 것에 이의를 재기하지 않는다. 어디 꽃 뿐일까? 동물들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문제일 뿐 그들의 모습은 늘 아름답다.
풍경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듯하다. 일단 풍경은 스스로 어디로 움직이지 않고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진에 담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풍경 역시 표정이 있어서 아름다운 표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아름다운 표정을 만나기 위해 수고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아직 그 많은 사진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멋진 꽃 사진, 동물 사진이 없는 것을 보면 내 실력이나 성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다. 그러나 내가 그만큼 사진에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다.
덕분에 내게 있는 아이들 사진이 나를 즐겁게 하는 유일한 사진이게 되었다. 요즘은 잘 모델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디를 가든지 “잠깐만 거기서봐!”를 외치는 아빠의 요구에 응답해 주는 녀석들이 고맙다.
녀석들 사진을 보면서 사람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본다. 어린 시절 철없는 시간을 지나 공부에 찌든 학창 시절이며 먹고 살기 바쁜 직장생활, 결혼과 자녀들을 얻는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인생의 연륜이 묻어 나는 장년, 노년의 삶의 각 표정들이 주는 아름다움은 이 세상 자연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주섬 주섬 아이들 사진을 물리고 그 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는 부모님의 웃음을 들여다 본다. 이미 인생의 여러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본다. 어쩌면 참 길고 쉽지 않았을 목회의 길을 마치고 은퇴하신 아버님의 여유로운 표정이나 어머님의 자유함을 다 담고 있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 사진에서 그 인생을 읽는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리네 삶이 다 각기 여러 사연을 가지고 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때로는 행복해 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힘겨운 시간과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한다. 그리고 그 모든것이 꿈 같이 이어져서 한 인생을 만들어 낸다. 그 얼굴에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남아 있다.
누군가의 얼굴에서 그렇게 지나온 삶을 열심히 살아온 믿음과 열심을 만나면 내 속에 일어나는 잔잔한 기쁨이 어느틈엔가 눈물로 표현된다. 시인 신광철의 시 “사람”은 이렇게 노래한다.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난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렇다’
그 눈물이 결코 슬픔이나 안스러움이지 않고 감사이며 기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