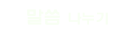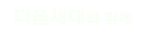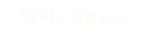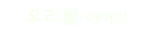주보에 싣기 위해 시를 찾다가 만난 김기대목사님이란 분의 글에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 “PRIEST”에 대한 글을 읽게되었다. 그 영화가 가진 여러 측면과 문제제기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라 주의깊게 읽게 되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삶, 그 삶이 가지는 무거움을 다시한번 생각한다. 영화의 주인공이 문제를 깨달아 가는 방식이나 영화의 형식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테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참 무거운 질문이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치열함과 신실함을 선포할만한가”하는 질문과 “설교자의 자격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말씀과 듣는 청자들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결해 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이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끊임 없이 죄의 지배와 유혹 아래 거주하며 산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문제는 아직도 육신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로부터 꾸준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의 삶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비난하느라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가지는 양면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양면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요구받는 사람들이란 양면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는 죄인이어서 용서 받은 은혜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기를 요구하기를 즐겨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젊은 신부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고 그를 둘러싼 동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지리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사제가 죄를 범하고 그것은 인지한 그곳에서 자기가 지키지 못한 어린 소녀의 용서를 통해 벽이 허물어지고 만다.
결국 우리는 용서와 화해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다. 다만 표피적인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한 용서와 하나님으로 부터 허락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윤동주라는 시인은 “또 태초의 아침”이란 시에서 이렇게 썼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電信柱)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啓示)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罪)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解産)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無花果) 잎사귀로 부끄런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아마도 시인은 자기가 또 다시 태초의 그 자리에 선다해도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 것 같다. 인간은 다 그렇다. 그 처럼 나도 똑같을 것이다. 아담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나 역시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시인 처럼 지금 내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