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종시인의 시중에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시에서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 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 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난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시에서 처럼 차를 마시거나 어느 곳에 앉아 있거나 혹은 풍경의 일부 처럼 녹아 들어 있을 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인가 봅니다. 아름다운 풍경 안에서 그 일부가 되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 보는 것이나 아니 직접 그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것은 참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긴 겨울을 지나면서 기다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 집 앞이며 지나는 길에 노랗게 올라오는 수선화가 가득한 풍경입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피는 수선화들은 그 꽃이 키도 크고 송이도 커서 여러송이가 함께 피어 있는 모양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드디어 긴 겨울이 끝이 났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풍경이어서 일겁니다.
겨울이 되면 하얗게 쌓인 눈이 온 세상을 덮어 온통 하얀으로 덮인 들판이며 숲의 풍경을 떠 올리고 여름이면 온통 푸른 나무들이 그 잎을 짙게 물들여 초록이 무성해져서 눈이 닿는 곳마다 지천으로 덮인 풍경이 떠 오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작은 개척교회 주일마다 울리던 차임벨과 일찍 일어나 예배당에 가서 피우던 톱밥난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오랜 기억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 시간에 일어 났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어딘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 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겨운 시간에 대한 기억 일 때도 있습니다.
문득 나는 어떤 풍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풍경에 자리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어린시절 친구들에게는 어떤 기억 속에서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쳤던 제자들과 청년들이나 함께 섬기던 교회의 지체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풍경으로 자리하고 있을지 별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기대하기는 그들의 기억 가운데 차라리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기억일망정 밉고 싫은 풍경의 일부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시간들이기에 돌이키기 힘들겠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정작 그런 생각에도 어떻게하면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로 피어 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기억을 뒤져보아도 그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로 자리하는 이들이 애스고 노력해서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전적인 선함이나 아름다움이 풍경을 변화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있던 그 시간과 공간이 내 기억에 아름답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삶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내는 자리이길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고 웃음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한 풍경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인자한 음성,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보시는 선한 눈빛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떠 올리며 가지는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가 되고싶습니다. 그 뒤를 따라 사랑을 말하고 전하며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풍경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것이 중요한 사람이지만 내가 속한 풍경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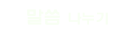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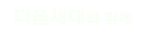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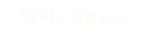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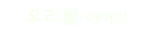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신실하지 못함을 위한 변명
신실하지 못함을 위한 변명
